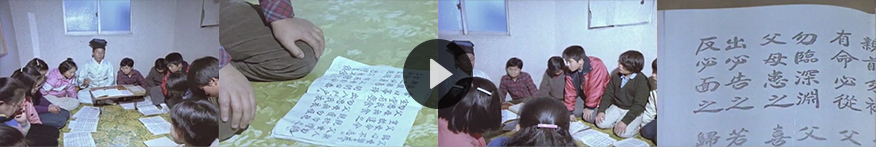기획 특집
학문과 예법을 지키다 “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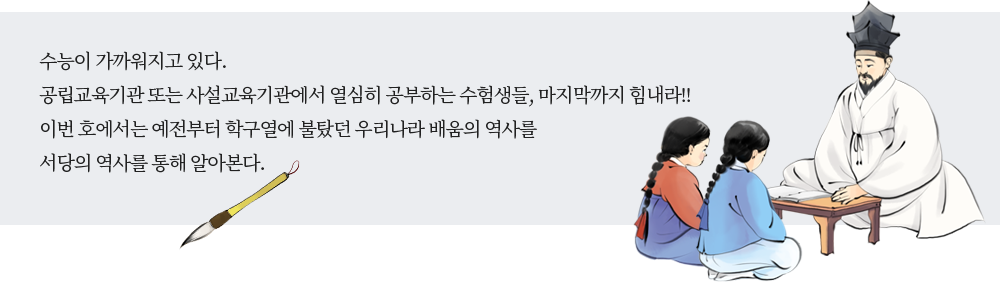
‘서당’이라고 하면 조선 후기 화가 단원 김홍도가 그린 ‘서당도(書堂圖)’라는 그림을 떠올릴 사람이 많을 것이다. 책상을 앞에 놓고 훈장이 앉아 있고, 바로 앞에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은 것으로 짐작되는 학생이 울면서 바지 밑단을 고쳐 매고 있다. 훈장 양옆으로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훈장 가까이에는 갓을 쓴 학생의 모습도 보인다. 「단원 풍속화첩」 중 제1폭인 ‘서당도’에 나오는 풍경이다. 재미있는 것은 종아리를 맞아 서러워 우는 학생을 사이에 두고, 훈장과 다른 학생들 모두 웃음기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이다. 비록 엄한 회초리는 있었어도 당시 서당의 분위기는 상당히 자유롭고 가족적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 풍속화이다.
01 100번씩 읽어 완전히 이해하도록 한 서당교육
서당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각 마을에 설립된 초·중등 단계의 사설교육기관을 말한다. 서당 설립의 주목적은 향촌사회에 상하의 분별을 포함한 예법과 글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 학생은 8~15세의 양반과 평민층의 자제들로 주로 강독(읽기), 제술(글짓기), 습자(쓰기) 등을 배웠다. 천자문을 시작으로 동몽선습, 사자소학 등의 기초교육 다음에는 명심보감, 채근담, 삼강오륜 등도 기본 교양으로 배워야 했다.
-

귀산 모범서당 전경
(1936) -

대관령서당 선생님과 학생들 기념 촬영(1959)
-

대관령서당 학생수업 광경(1959)
공부는 강(講)이 주된 것이었다. ‘강’이란 배운 글을 소리 높여 읽고 질의 응답하는 것으로 매일 학생의 실력에 맞게 범위를 정하여 숙독한 횟수를 세는데, 보통 100번씩 읽도록 했다. 이튿날 ‘배송(背誦: 등지고 앉아 책을 보지 않고 암송하는 것)’ 한 후 다음 단계로 나아갔고, 배송을 다 하지 못하면 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시켰다. 또한 ‘야독(夜讀)’을 장려하여 자정이 넘도록 학생들이 등불 아래 글을 읽는 소리가 마을에 퍼졌다고 한다.
계절에 따라 학습 내용을 달리하기도 했다. 즉, 겨울에는 경사(經史)와 같은 어려운 학과를 배우고, 여름에는 흥취를 돋우는 시(詩)와 율(律)을 읽고 짓는 흥미 위주의 학습을 하였으며, 봄·가을에는 밤이 짧으므로 야독을 중단하고 4율을 짓게 하였으며, 낮에는 독서 대신 습자를 연습시켜 졸음과 게으름을 쫓아버리도록 배려하였다. 한창 놀이를 즐기는 연령의 학생들이므로 계절학습과 함께 ‘놀이학습’도 병행하였다. 놀이공부로는 옛사람의 시구(詩句) 한 구절을 부르고 그 대구(對句)를 찾는 일종의 시공부 놀이인 ‘초(初)·중(中)·종(終) 놀이’와 8도(八道)의 군 이름을 기억시키는 '고을 모둠놀이' 등을 이용하였다.
02 유배지에서 서당 열어 제자를 배출하기도
서당은 비형식적인 사설교육기관으로 누구나 자유로이 설립·폐지할 수 있었다. 훈장은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았고, 학식의 정도도 일정하지 않았다. 간혹 조정에서 관리로 종사하다가 낙향 또는 귀양 온 선비들이 훈장이 되면, 학문이 높은 인물이라는 점 때문에 인근의 양반 자제들이 몰려오기도 했다. 일례로 조광조의 스승 김굉필도 귀양 와서 조광조를 가르쳤고, 정약용도 유배지인 전라남도 강진의 다산초당에서 많은 제자들을 배출했다. 후에 정약용의 제자들과 그 후손들은 20세기까지 정약용의 집안을 도왔다는 훈훈한 기록도 있다.
훈장들의 보수는 주로 쌀이나 땔감, 옷감 등이었는데, 넉넉하지는 않았다. 지금의 학원비에 해당하는 쌀을 강미(講米)라고 하는데, 대개 초학자(신입생)에게는 1년에 벼 반 섬, 그 이상의 학생들에게는 한 섬(10말)을 받았다고 한다. 이외에도 서당에 처음 입학하는 날 훈장에게 술, 닭, 옷감 등의 예물을 드리기도 했고, 책을 한권 다 배우고 나면 ‘책걸이’라는 간소한 잔치를 베풀기도 했다. 훈장은 마을의 지식인으로 학부모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문맹이 많았던 시대여서 편지가 오면 대신 읽어주고, 제사 때 쓰는 지방이나 축문 등을 대신 적어주는 마을의 대서(代書) 역할을 했다.
03 부자 평민층 늘면서 서당의 숫자도 늘어
고려시대나 조선 전기에는 서당의 수도 많지 않았고, 주로 양반의 자제들이 다녔으나, 조선 후기 부자 평민층이 늘어나면서 서당의 수도 늘고 교육을 받는 평민층이 늘어났다. 이 시기부터 서당을 자연발생적인 형태로 놔둘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는 서당이 비록 자유로운 사립교육시설이지만 교육문화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7세기에 서당이 전국 방방곡곡에 널리 퍼지면서 훈장들의 교육수준도 천차만별이 되자, 18세기에는 지방관의 주도하에 면(面) 단위마다 훈장들 중 한 명을 지정해서 ‘면훈장제(面訓長制)’를 두어 통제하려 하였다. 효종 10년(1659) 송준길은 「향학지규(鄕學之規)」에서 다음 규정을 제안했다. 즉, ‘훈장은 각 고을에 고르게 두고, 수령은 때때로 친히 이들을 돌보고, 학도들을 시험해 보며, 만일 실적을 올린 자가 있을 때는 세금을 면제하고, 학도에게는 상을 주며, 그 중 가장 뛰어난 자는 동몽교관(童蒙敎官, 어린이를 가르치기 위해 각 군현에 둔 관리)이나 다른 관직을 주어 권장할 것’ 등이다. 조정에서는 서당에 관한 여러 가지 진흥책을 폈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조선 말기에는 서당의 교육내용이 점차 부실하고 형식에 그치게 되었다.
이러한 서당교육의 정체성을 극복하고자 정약용, 유형원, 이승희 등은 ‘교육체제일원화’를 주장하였다. ‘지방의 서당에서부터 중앙의 최종 교육기관인 태학에 이르기까지를 하나의 조직 속에 편입시키자’는 얘기였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오랜 기간 초등교육과 민족교육의 중요한 축을 담당했던 서당은 1930년대 중반 이후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갔다. 1930년에는 서당 1만 36개에 학생 15만 892명이던 것이 1940년에는 3분의 1로 감소되었고, 광복 후 「교육법」 제정에 따라 학제가 정비되면서 서당은 소멸되었다. 오늘날에도 간혹 '--서당'으로 이름을 붙여서 전통 예절과 한문 등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서당’이란 명칭을 쓰고 있을 뿐 예전의 서당과는 다소 다른 형태이다.
-

학동마을 서당(1987)
-

청학동 서당(1995)
-

남원서당(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