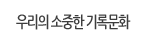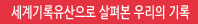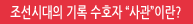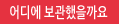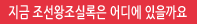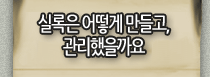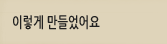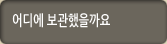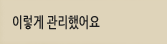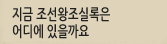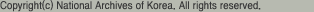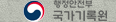실록은 후대 사람들에게 역사적 사실과 교훈을 전하기 위해 편찬되었기 때문에, 실록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일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실록은 종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천재지변에 의해 없어질 위험이 크고, 또 곰팡이나 세균 등으로 인해 훼손될 수 있었기 때문에 실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실록을 보관하기 위한 특별 장소로 ‘사고’를 만들었습니다.
조선왕조 초기에는 내사고인 서울의 춘추관사고와 외사고인 충주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종대왕 때에 2개의 사고로는 실록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경상도 성주와 전라도 전주에 사고를 추가로 건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전기에는 총 4개의 사고가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에 4개의 사고 중 춘추관사고, 충주사고, 성주사고가 불에 타면서 사고에 보관되어 있던 실록도 모두 불타 없어졌고, 오직 전주사고의 실록만이 지역 주민들과 사고 관리인들의 빠른 대처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에는 사고를 인적이 드물고, 보다 안전한 깊은 산속에 설치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조선후기의 새로운 사고는 강화도 마니산, 평안도 영변의 묘향산, 경상도 봉화의 태백산, 강원도 평창의 오대산에 외사고가 설치되어 내사고인 춘추관과 함께 5개의 사고 체제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리고 강화도 마니산사고는 병자호란으로 이후 정족산사고로, 묘향산사고는 여진족의 침략 위험이 높아지자 전라도 무주의 적상산사고로 이동 설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