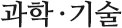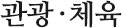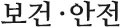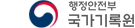2010년 11월 24일 신문과 방송에는 짤막한 부고(訃告)기사 하나가 보도되었다. “허문회, 작물육종학자, 서울대 명예교수, 향년 83세로 별세.” 국민들 가운데 그를 기억하거나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다만 그의 부고 끝에 ‘통일벼의 아버지’란 설명을 보고서야 아는 사람은 알았다. 그리고 이 인물과 항상 세트로, 통일벼 얘기라면 함께 떠오르는 사람이 당시 농촌진흥청장을 맡았던 김인환이다. 이 두 사람이 ‘기적의 볍씨’로 불리는 다수확품종 ‘통일벼’를 만들어낸 주인공들이다. 그 가운데 허문회 박사가 일생을 마치고 영면에 들었다는 소식이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누대(累代)에 걸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일제강점기의 수탈시대를 살았고, 광복이 되고 6.25전쟁을 맞아 더욱 굶주림과 배고픔에 허덕여야 했다. 1960년대에 제3공화국은 무엇보다 시급한 민생고 해결을 최우선으로 삼았지만, 그게 말대로 그리 쉽지가 않았다. 농토와 수확량은 한정돼 있고, 날이 갈수록 배고픔에 시달리는 국민들은 늘어만 가고, 외국의 원조는 줄어들고,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은 배가 고파도 참고 아끼고 덜 먹는 일 뿐이었다.
‘쌀 아끼기 운동’에서부터 ‘분식장려’, ‘일주일에 하루 쌀 안 먹는 날’ 지키기, 곡식 한 톨이라도 없애는 ‘쥐잡기운동’ 등 별의별 묘안을 다 짜내봤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었다. 해마다 봄철 보리가 익기 전 모두가 굶주려 먹을 것을 찾아 나서도 뾰족한 방법이 없어 이 시기를 이른바 ‘보릿고개’라 불렀다. 자유도 민주주의도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가능하다는 당시의 통치이념으로 우선 국민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길을 찾아 온갖 고민을 다하던 때였다. 오죽하면 정보요원이 이집트에서 다수확품종 볍씨를 몰래 들여오기까지 했겠는가. 하지만 그 볍씨는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품종으로 재배단계에서부터 실패하고 말았다.
그렇다면 우리 땅에 맞는 볍씨를 어디서 구해올 수 있을까. 아니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땅에 맞는 다수확품종을 개발해야 했다. 어차피 한정된 땅이라면 그 땅에서 많이 수확하는 방법밖에 더 있겠는가. 농촌진흥청을 통해 이미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가 있는 상태였다. 언제까지 분식만을 장려하고 매끼마다 쌀 한줌씩 아끼라고만 할 것인가. 이 무렵에 나온 것이 즉석간편식 라면이기도 하다. 그 라면의 등장이 얼마나 반가웠던지 군대에까지 보급하던 시절이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농촌진흥청(당시 청장 김인환)은 곧 바로 서울대학교 작물육종학 허문회 교수를 필리핀에 있는 국제미작(米作)연구소(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IRRI)로 보냈다. 이때가 1964년이었다. 품종개량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면서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있는 벼를 골라오라는 것이었다. 그때는 볍씨가 많은 다수확품종은 동남아를 비롯한 열대지방에서 재배하는 벼뿐이었다. 막상 가서 보니까 그 품종은 우리나라와 같은 온대지방에서는 키울 수 없는 품종이었다.
그래서 허문회 교수는 새 품종을 개발하기로 마음먹고 계속 교배조합을 바꾸어 가며 연구를 이어나갔다. 그러니까 기후가 찬 데서도 잘 자라면서 다수확을 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다가 드디어 문제의 볍씨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우리나라에 맞는 다수확 벼 개발에 착수해 기적의 볍씨 ‘IR667’이 탄생하기까지 믿고 밀어준 농촌진흥청장 김인환의 안목과 합작품이었다.
이 볍씨의 개발소식은 곧바로 본국에 알려졌고 학수고대 하던 대통령의 귀에까지 들어가 즉시 시험재배를 지시하였다. 그리고 그 후 3년간의 시험재배 끝에 드디어 1969년 ‘IR667’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자라는 다수확 벼로 확인돼 ‘통일벼’라는 이름을 달고 전국 농가에 보급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다. 보급 첫 해의 통일벼는 자연재해와 농가의 재배기술 부족으로 생각만큼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통일벼의 질이 나빠 한국인의 입맛에 맞지 않고, 줄기가 짧아 볏짚의 유용성도 떨어진다는 이유로 재배를 주저하는 농민도 적지 않게 생겨났다. 오죽하면 당시 짤막하고 키 작은 사람을 통일벼라고 놀렸겠는가. 그때는 농촌에 초가집이 많아 볏짚의 효용성도 큰 편이었다.
사실은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그 무렵 거의 동시에 불붙기 시작한 새마을운동에서 초가집 없애기가 맨 먼저 대두되지만, 적잖은 농민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앞장서 범정부적으로 통일벼 보급을 독려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1970년에는 대통령 자신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밥맛이 있나 없나에 동그라미를 치는 검정조사표에 사인을 해 내려 보내기도 했다. “지금 밥맛이나 쌀의 질이 문젠가. 그보다 먹고 사는 게 먼저지.” 식량부족으로 다급해진 정부는 이와 같은 논리로 전 농가의 통일벼 재배를 밀어붙였고, 그 사이 허문회 교수는 계속해서 농촌진흥청 연구원들과 통일벼의 문제를 개선하는데 주력하며 보급을 도왔다.
“잘 살아 보세, 잘 살아 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 보세~”. 때마침 불어 닥친 새마을운동과 이런 노래로 대세는 이미 기울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사이의 식량증산정책과 새마을운동에는 우리도 한번 잘 살아 보자는 국민적 염원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다. 산업화의 물결은 중공업과 중화학시대로 접어드는 한편, 농촌에서는 그 사이 많이 진화된 기적의 볍씨 ‘통일벼’로 해마다 벼농사 풍년가가 울려 퍼지게 되었다. 덕분에 한국은 통일벼가 보급된 지 5년만인 1975년에 국가가 목표로 삼은 식량자급의 성공을 선언한다. 한국식 ‘녹색혁명’을 일구어낸 것이었다.
통일벼가 어떻게 생긴 모양인지 궁금한 사람은 당장 50원 짜리 동전 한쪽 면에 새겨진 벼이삭을 보면 된다. 얼마나 고맙고 감격스런 볍씨였으면 누구나 쓰는 동전에 새겨 넣기까지 했겠는가. 세상에 어떤 설움도 배고픔만한 설움은 없다. ‘잘 살아 보세’와 잘 산다는 기준은 여러 가지로 다르겠지만, 통일벼가 처음 나오던 1970년대 초만 해도 우리가 북한보다 못 살고 굶주리던 시기였다. 그런 우리가 이 기적의 볍씨 하나로 배고픔에서 벗어나고 식량자급이라는 녹색혁명을 이뤄냈다. 그 후 치욕의 보릿고개란 말도 사라졌고, 최소한 먹는 것에 비루하지 않는 자신감으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열심히 새마을운동과 조국근대화와 산업화로 매진해 나갔다.
- 김인환, 『한국의 녹색혁명』, 농촌진흥청, 1975.
- 월간중앙, 『한국을 바꾼 100인』, 중앙일보, 1995.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