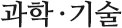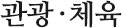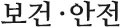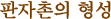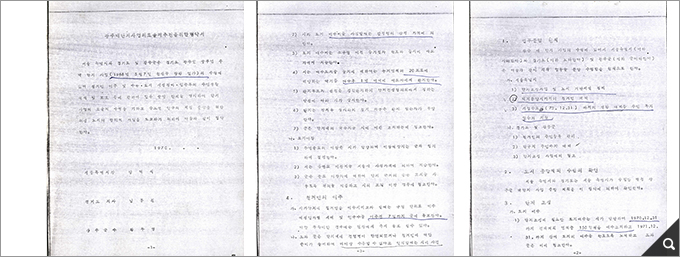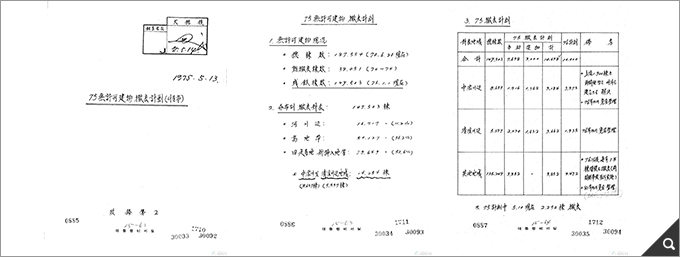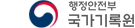청계천문화관 바로 앞엔 판자촌이 있다. 예전 청계천 주위에 가득했던 판자집을 재현해 놓고 그 시절 생활용품과 문화를 전시해 놓은 곳이다. 1960~1970년대 판자집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온 듯이 추억에 잠기고, 젊은이들이나 어린아이들은 무척 신기해하며 구석구석을 둘러본다. 이젠 전시·체험을 통한 추억의 대상이 되어 버린 판자집에서 40~50년 전 다같이 못 먹고 못 살던 우리 서민들은 고달픈 삶을 극복하며 희망을 만들어 나아갔다.
우리나라 판자촌이 처음 형성된 것은 일제강점기의 토막민촌이라 할 수 있다. 수탈로 인해 터전을 잃고 먹고살기 힘들어진 농촌의 빈농들은 상공업과 교역이 활발한 서울로 모여들었다. 이들은 대개 사대문 밖이나 산중의 바위 위에 일실(一室) 형태의 초가집이나 토막집을 짓고 살았다. ‘토막(土幕)’은 허술한 움막을 의미하며 용두정, 제기정, 이촌정, 아현정 등에 토막민촌이 형성되었다. 그러다가 광복을 맞아 귀국하게 된 동포들과 남한으로 이주한 월남민들은 심각한 주택난과 경제난으로 임시 거처인 판자집을 지어 모여 살게 되었는데, 6.25전쟁을 거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전쟁으로 인한 거주지의 파괴와 피난민, 월남민들이 급증하면서 피난처와 같은 천막촌, 판자집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주로 남산 일대의 6.25전쟁촌, 서부이촌동, 청계천, 금호동 일대가 대표적인 판자촌이다. 이 시기 판자집은 합판, 깡통생철, 천막천, 가마니, 신문지, 나무토막 등을 활용해서 만들어졌다.
1960년대 들어서면 새로운 판자촌이 형성되었다. 산업화에 따른 이농현상으로 매년 50~70만 명의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어 도시빈민촌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 시기 판자집들은 판자와 블록 등으로 벽과 담을 만들고 초가와 루핑(roofing)으로 지붕을 이어 만들었다가 1970년대 이후 새마을운동과 도시재개발 사업으로 지붕은 기와와 슬레이트, 벽과 담은 시멘트로 보수·개량하게 되었다.
임시거주지 형태의 판자집들은 대부분 무허가주택이었다. 상․하수도 및 오물처리시설 등이 갖추어지지 않아 보건위생이 매우 취약했고, 노후한 건물들이 무질서하게 밀집되어 있어 화재 발생의 위험성과 진화가 어려운 환경이었다. 또한, 범죄발생률이 높아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집단이주, 시민아파트 건설, 주택재개발 등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판자촌에 대한 철거와 정비를 단행했다.
휴전 직후인 1954년부터 정부는 도시 안에 판자집의 신축을 금지하고, 50년대 후반부터는 강제철거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판자촌 철거계획은 이주 대책 없이 철거만을 강행하여 반발이 극심했다. 갈 곳 없는 판자촌 주민들은 철거 지역에 다시 무허가 주택을 짓는 등 판자촌 철거정책은 별다른 효과도 거두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1958년 미아리 지역을 정착지로 정하고 조성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급격한 이농현상으로 인해 판자촌은 더 증가하여 정부는 도심 외곽에 무허가 거주촌을 조성한 후 양성화정책을 통해 불법거주를 합법화시키는 이주사업을 실시했는데, 1969~1971년 추진된 경기도 광주이주사업이었다. 청계천변 복개공사와 세운상가 아파트 건축으로 발생한 이주민 23,692세대, 114,455명이 경기도 광주로 이주하였지만, 생계대책이 없던 주민들은 1971년 광주대단지사건을 일으켰다.
이외에도 정부는 판자촌 철거와 이주정책을 꾸준히 시행하여 서울시 외곽인 미아, 상계, 도봉, 쌍문, 수유지역과 홍은, 남가좌, 북가좌, 수색, 연희, 사당, 봉천, 신림, 시흥, 구로, 가락, 거여, 마천지역 등에 정착시켰다. 1973년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이 법제화되면서 무허가 판자집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2010년 현재 국내 판자집, 비닐하우스의 숫자는 15.344호, 16,880가구이며, 서울지역에는 3,255호, 3,711가구 정도가 남아 있다.
-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 전남일, 「‘최소한의 주택’의 사회사적 변천과 공간 특성」,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7호, 2011.
- 최강민, 「조국 근대화와 스펙터클이 지배한 1960년대의 서울 풍경」, 『語文論集』40호,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