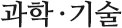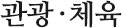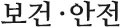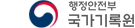1970년 정부는 「저축증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저축추진중앙위원회’라는 조직을 전국으로 확대시켜 활동을 활성화했다. 한 마디로 저축만이 살 길이고, 어떻게든 저축을 늘려서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꾀하자는 생각이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71년을 ‘저축 1조원 돌파의 해’로 정하고 범국가적인 저축증대운동과 캠페인에 들어갔다.
당시 목표로 삼은 ‘민간저축 1조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 6.25전쟁으로 인한 폐허와 절망의 땅에서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광복 이후 정부수립에서부터 저축은 늘 강조되어 왔지만 소득이 없는 국민들로서는 공염불에 불과했다. 하지만 국고가 텅 비어있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아무리 경제를 일으켜 세우려 해도 되는 일이 없었다.
그러다가 1962년 제2차 통화개혁을 단행하는 등 혁명적인 조치를 취해봤지만 1966년까지는 해외에서 끌어들인 돈이 총투자의 54.3%에 달했다. 외국 돈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경제를 발전시켜 소득증대도 꾀해야겠고, 소득증대가 있으면 국내 저축의 여력도 생길 것이고, 그 자금을 다시 기업에 투입해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선(善)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그것이 가능할까. 이때 나온 말이 “허리띠 졸라매고”, “티끌 모아 태산“이었다.
그때 우리에게 있어 저축은 쓰고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다. 근검절약 그리고 저축이 미덕이 되는 사회풍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었다. 주부들이 가정에서 삼시세끼 밥 할 때마다 무조건 쌀 한줌씩을 덜어 항아리에 모으는 것으로 저축운동은 시작됐다. 어느 정도 모인 쌀은 내다팔아 송아지도 사고 돼지도 키우고, 그렇게 모은 돈은 다시 항아리에 묻거나 하는 방식이었다.
말하자면 투자하는 저축이 아니라 화폐의 사장(死藏)이었다. 크든 작든 그 돈을 금융기관에 맡기고 다시 그 돈은 기업으로 흘러가고, 기업은 자꾸만 생산을 늘려서 경제규모를 키워가야 제대로 된 저축인데 초기에는 그런 것이 되지 않았다. 기껏해야 돼지저금통 정도였다. 그래서 정부는 1962년 2월에 「국민저축조합법」을 만들어 우선 직장단체와 지역별로 매일 일정액 이상을 저축하도록 했다. 일종의 강제성을 띤 저축이었다. 내일을 위해 지금은 좀 덜 먹고, 덜 입고, 덜 쓰고, 그 대신 저축을 해서 미래를 꿈꾸는 통장을 만들자는 운동을 편 것이었다.
1964년에는 제1회 저축의 날을 만들어 이때부터 저축 성공사례를 발굴해 전국적으로 알렸다. 해마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표창도 하는 행사를 열고 갈수록 적극적인 국민저축운동을 벌여나가자 국민들의 저축심은 그야말로 요원의 불길처럼 타올랐다. 범국민 저축생활화운동을 벌이고, 여성저축생활화전국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고속도로변에 야립(野立) 간판을 세우거나 계몽영화를 만들어 극장에서 틀어댔다. 특히 방송에서는 저축 관련 프로그램들을 정규편성했다. 물론 소득증대와 연관시킨 저축 프로그램들이었다.
그러면서 1965년 9월에는 금리를 현실화하고 각종 금융제도를 개선해서 민간저축과 나라에서 걷는 세금 등의 강제저축을 병행해 나갔다. 한 푼이라도 금융기관에 맡기면 그만한 이자를 붙여 그 돈이 불어나게 하고, 그 돈은 다시 기업에 투자해 공장도 돌리고 상품도 만들었다. 경제개발계획 초기에는 투자재원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빌렸지만, 국내 저축이 차츰 늘어나자 기업의 자금조달은 훨씬 수월해졌다.
1970년대 이후 고도 성장기에는 기업 등의 이른바 법인저축이 앞서기도 했지만, 여전히 사채의존도가 큰 기업들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972년 8월 3일에는 드디어 ’8.3조치‘라는 충격요법으로 모든 사채(私債)를 일시적으로 동결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드디어 1971년에 저축 1조원 돌파시대를 연 것이다. 온 국민이 총궐기해 십시일반(十匙一飯) 모은 돈으로 국가경제를 뒷받침하는 저력을 발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76년 박정희 대통령은 ’저축은 국력‘이라는 친필 휘호를 써서 전국에 배포하기도 했다. 모든 금융기관과 관공서 벽에는 이 휘호를 액자에 넣어 걸었다. 그리고 계속 제도를 보완하고 정비해 나갔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1976년 4월부터 실시한 ’재산형성저축‘이다. 중산층 이하 근로소득자들의 저축증대를 목표로 만든 ’재형저축‘이란 제도로, 일정액을 저축하면 그만한 세제상의 혜택과 이자율을 높여주는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이때부터 적금과 예금통장을 누가 몇 개를 더 가지느냐를 은근히 자랑하기 시작했고, 통장의 숫자와 돈이 불어나는 재미와 함께 오로지 저축만이 자신의 재산을 불려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돈이 생기면 은행에 갖다 맡기고, 그 통장에 돈 불어나는 즐거움이 또 다른 희망과 행복으로 다가왔다.
1977년 4월에는 가계당좌예금제도까지 신설되어 개인의 통장잔고 범위 내에서 언제든 자기가 수표를 발행하는 ’가계수표제도‘까지 도입되었다. 이것은 곧 다가올 신용카드시대와 함께 신용거래의 기반을 조성함과 아울러 또 하나의 저축증대의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야말로 저축이 국력이었다. 경제발전의 기틀을 갖추고 국민 개개인의 재산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저축이 해냈다. 그때그때 정부의 맞춤제도와 국민들의 근검절약 정신과 저축의 생활화가 합쳐져 만들어낸 또 다른 형태의 경제적 기적이었다. 1980년에는 우리나라 저축액이 8조 7,025억 원으로 늘었다. 그러던 것이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민간저축은 차츰 하락하고 있다. 2015년 현재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가 거의 없는 1% 미만시대로 접어들었다. 급기야 국민저축시대는 끝나가는 것인가.
- 브리태니커, 한국브리태니커회사
- 신동아, 『개항 100년 연표자료집』, 동아일보, 1976.
- 전완길 외(공저), 『한국생활문화 100년』, 도서출판 장원,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