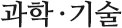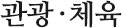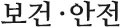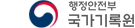1970년 7월 7일, 그날은 실로 역사적인 날이었다. 거리 곳곳에 경축아치가 세워지고 전국이 축제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공사로 불리던 경부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되는 날이었다. 총 428km의 구간 가운데 마지막 대구와 부산 사이가 완공됨에 따라 드디어 그 개통식이 성대하게 열리게 되었다. 사람들의 가슴에 이제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꿈과 야망과 도전과 번영의 길이 뚫린 것이다.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형편에 자동차도 몇 대 없는 나라에서 고속도로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그까짓 길은 닦아서 유람이나 다닐거냐며 극구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았다. 심지어 야당의 거물급 인사 가운데 한 사람은 고속도로 기공식을 하는 날 불도저 앞을 가로막으며 길바닥에 드러눕기까지 했다.
그러나 당시 집권세력의 생각은 달랐다. 무슨 짓을 해서든지 조국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뤄 가난에서 벗어나고 번영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국민의식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리라 믿었다. 물론 당장은 이 길로 실어 나를 수출상품도 많지 않고 고속도로 위를 쌩쌩 달릴 자동차도 별로 없지만,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도록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보자는 의욕과 의지가 넘치는 기폭제 같은 길이었다. 길이 먼저냐, 실어 나를 물건이 먼저냐는 단지 순서나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특별한 부존자원도 없는 우리 같은 나라에선 국민들의 의욕과 자신감이 무엇보다 큰 자산이라고 생각했다. ‘언제까지 이 좁은 땅덩어리에 쪼그리고 앉아서 굶고만 있을 것인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고속도로 건설의 꿈은 박정희 대통령의 독일( 당시는 서독) 방문으로 싹트기 시작했다.
1964년 박정희 대통령이 차관을 얻으러 서독을 공식 방문했을 때, 국빈용 승용차에 몸을 싣고 그들이 전후(戰後) 번영의 상징으로 자랑하는 고속도로 ‘아우토반’을 시속 1백 60km로 달리면서 이를 악물고 결심을 굳혔다. 그리고는 귀국하자마자 고속도로 공부에 매달렸다. 각국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관한 기록을 밤늦도록 검토하고,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듣고 연구보고서를 제출받기도 했다. 국토를 개조해서라도 가난을 물리치겠다는 패기만만한 40대 젊은 지도자의 야망이 꿈틀댔다. 밤늦게 혼자서 인터체인지(Interchange)도 직접 그려보고, 한반도 지도를 놓고 어떻게 하면 가장 적은 경비로 가장 짧은 기간에 완공시킬 수 있을지 수없이 줄을 그어보기도 했다.
당시의 각 부처 장관이나 국장급 이상의 고위공무원들은 모두 30대 전후의 젊고 패기 넘치는 엘리트 관료들이었다. 나라를 위해서라면 개인적인 희생과 헌신,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욕과 무서운 각오로 덤비던 그런 시절이었다. 정부의 모든 부처가 일심협력하여 오로지 조국근대화라는 절대 명제에 매달리던 때였다. 실제로 경부고속도로와 관련된 작업이 이뤄질 때, 대통령의 결재란 밑에 가장 자주 쓰인 친필의 당부사항은 “각 관련 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가졌는가.”였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대통령의 구상이 구체적으로 다져질 즈음, 당시 현대건설의 정주영회장이 청와대로 불려 들어갔다. 그때 이미 현대건설은 태국에서 고속도로를 만든 경험이 있었다. 우선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고속도로 건설에 들어갈 예산을 뽑았고, 예비비까지 합쳐 전체예산을 4백 30억 원으로 확정지었다. 처음 설계 당시 확정한 경부고속도로는 총 길이 428km, 나중에 실제 완공되었을 때 든 비용이 429억 원이었으니까 1km당 약 1억 원 밖에 들지 않은, 세계에서 가장 싸게 먹힌 고속도로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1968년 2월 1일에 착공해서 1970년 7월 7일 약 2년 5개월 만에 개통을 한 것이다. 준공식 테이프를 끊는 자리에는 대통령 내외와 민간건설업자 대표로 정주영이 나란히 섰다. 감격의 순간이었다. 밤을 새워 터널을 뚫고 다리를 놓고,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기적을 이뤄낸 그야말로 피와 땀의 결정체였다. 그저 하나의 거대한 토목공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이때 생겨난 에너지와 자신감으로 우리는 경제대국으로 가는 길에 보다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그때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이었고, 이 보다 앞서 1968년에 서울-인천 간 경인고속도로가 먼저 개통되었다. 크고 작은 국내 건설사 17개 회사들이 달려들어 마침내 대 역사(役事)를 해낸 것이다.
외국자본이 한 푼도 안 들어간, 순전히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순전히 우리의 기술로, 물류수송의 일대 전환과 혁명을 이뤄냈다. 연인원 9백만 명이 동원됐고 건설과정의 희생자는 77명이었다. 이때 생긴 “빨리빨리”는 훗날 적잖은 부작용을 낳기도 했지만 예산사정상 그때 고속도로 폭을 불과 4~6차선으로 밖에 만들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시 우리 경제력의 어쩔 수 없는 한계였다. 경부고속도로의 정식 명칭은 ‘경부고속국도 제1호선’ 또는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로 바뀌었다.
이후 고속도로가 지나는 길목마다 공업단지와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거기서 생산되는 수출품들을 끝도 없이 실어 나르는 산업의 대동맥으로, 물류수송의 획기적 일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자동차, 제철, 정유공장 등의 관련 산업이 경부고속도로를 축으로 자리 잡았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불과 4시간대에 갈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다. 드디어 ‘일일생활권’이란 말이 나오게 되었고, 부산항은 ‘메이드 인 코리아’의 제품을 전 세계로 실어 나르는 국제적인 항구로 거듭나게 되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그 후 국내의 모든 도로를 고속화하는 정책의 근간이 되어 4,000km이상의 고속도로를 보유하게 되었다. 호남선과 영동선, 동해선과 서해안선, 중앙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중부내륙과 88올림픽도로와 대전과 통영 간, 서울에서 춘천, 충남 당진과 경북 영덕을 동서로 연결하는 민간자본의 고속도로까지. 동서와 남북 간으로 마치 거미줄처럼 얽혀있고, 그 위로 승용차와 화물차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는 그저 단순한 길이 아니라 우리의 꿈과 도전정신 바로 그것이었다.
- 신동아, 『개항 100년 연표자료집』, 1976.
- 한국도로공사, 『한국고속도로 10년사』, 1970.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