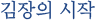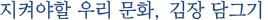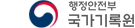2013년 12월 5일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서는 제8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 정부간 위원회가 열렸다. 이 위원회에서는 김장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이는 김치라는 음식을 등재한 것이 아니라 김장이라는 우리 문화를 등재한 것이다. 그래서 등록된 정식 명칭도 ‘김장, 한국의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문화(Kimjang : Making and Sharing Kimchi in the Republic of Korea)’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식문화인 김장문화는 전 세계인이 함께 보호하고 전승하는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채소를 절인 음식은 다른 문화권에도 많지만, 우리나라처럼 겨울이 오기 전에 온 국민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집중적으로 김장을 만들어 저장해 두는 풍속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김장은 개별적인 음식문화로 지역에 따라 담그는 법이나 김치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지만, 이웃 간에 품앗이로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담그는 공통점이 있다. 최근에는 봉사단체에서 몇 백 포기의 김장을 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김치를 나누어주는 활동도 있다. 이처럼 김장은 단순한 음식문화가 아니라 나눔과 공동체의식을 느끼게 하는 우리만의 정서가 담긴 고유한 풍습이며,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문화유산이다.
입동(立冬) 전후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는 시기가 되면 도시나 농촌 할 것 없이 김장담그기를 서둘렀다. 기나긴 겨울의 첫 준비는 김장 담그기였고, 김장은 ‘겨울의 반양식’이라고까지 불릴 만큼 꼭 필요한 음식이었다.
김장의 시작은 옛 문헌에 기록으로 남아 있다. 고려시대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에는 “무를 소금에 절여 구동지(舊冬至)를 대비한다”는 구절이 있고, 채소가공품을 저장하는 ‘요물고(料物庫)’라는 것이 있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김장은 고려 때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가정의 1년 계획으로 봄 장 담그기와 겨울 김장담그기가 중요하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무 배추 캐어 들여 김장하오리다. 앞 냇물에 정히 씻어 함담(鹹淡)을 맞게 하소. 고추, 마늘, 생강, 파에 젓국지 장아찌라. 독 곁에 중두리요, 바탱이 항아리요. 양지에 가가(假家) 짓고 짚에 싸 깊이 묻고······”라는 내용이 조선 헌종 때 정학유(丁學游)가 지은 가사집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 10월조에 실려 있다. 이러한 기록들을 고려해 볼 때 조선시대에는 겨우내 식량으로 김장을 담그는 일이 풍속처럼 퍼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때의 김장은 요즘처럼 통배추를 이용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오늘날과 같이 통배추를 사용한 김장김치가 등장한 것은 조선후기 이후 중국에서 품종 육성된 결구(結球)배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부터이다. 따라서 지금 흔히 먹는 배추 통김치는 속이 찬 배추가 생산되기 시작한 1800년대 말부터 담근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 나는 좋은 배추로는 방아다리, 느리골, 훈련원 등에서 나온 배추였다. 방아다리는 지금의 서울 종로구 충신동이고 느리골은 효제동이며 훈련원은 동대문운동장 근처이다. 이곳에서 나는 배추들은 거의 양반집에 공급되었고, 보통 사람들은 녹번동, 제기동, 마장동의 배추를 사다 먹었는데, 그곳에 집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경기도 양주군이나 파주, 광주 등의 배추가 김장용으로 서울에 들어왔다. 김장철이 되면 곳곳에 임시 김장시장이 열렸는데, 서울에서는 남대문, 동대문의 큰 시장과 낙원동, 공평동, 통인동 등에 임시 김장시장이 열리고는 했다. 지방에서 김장거리가 서울로 들어온 것은 광복 이후의 일이다.
배추가 준비되었다고 해서 김장 준비가 끝난 것은 아니다. 김장은 겨우내 먹는 음식이지만,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오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우선 봄에 좋은 소금을 골라 간수가 잘 빠지도록 보관하고 마늘도 잘 말려 매달아 두었다. 여름이면 고추를 잘 말려 고춧가루를 준비한다. 소금에 절여두었던 생멸치는 가을에 걸러 멸치 액젓을 만든다. 물론 배추, 무, 갓, 파 등 그 사이 사이 잘 가꾸어야 한다. 김장 직전에는 맛과 영양이 가득한 굴과 생새우 등을 준비한다. 이처럼 김장은 모든 재료 준비에 반년 이상이 걸리는 큰 행사였다.
요즘은 절임배추가 나오고 거의 소가족 위주의 주거생활이다 보니 많은 양의 김장을 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보통 한 접(100통), 두 접(200통) 또는 그 이상 김장을 하는 집들이 많았다. 이렇듯 많은 양의 김장을 했기 때문에 서울의 이화, 평양의 숭의학교 등에서는 11월 중에 김장 방학이라는 1주일간의 임시 방학이 있기도 했다. 보통 김장모습은 온 동네 여인들이 모여 품앗이로 서로의 김장을 도왔다. 한 쪽에서 절이고 한 쪽에서는 양념을 만들고 다음날 절인 배추를 양념과 버무려 김치를 담근다.
김장에는 통배추김치, 보쌈김치, 동치미, 고들빼기김치, 섞박지 등이 있지만, 이들은 각각 지방의 풍습, 기호에 따라 다르고 김치의 재료와 양념, 담그는 법과 시기가 다르며 맛도 다양하다. 추운 북쪽지방은 기온이 낮으므로 소금 간을 싱겁게 하고 양념도 담백하게 하여 채소의 신선미를 그대로 살리는 반면에, 기온이 높은 남쪽지방은 간을 세게 하고 빨갛고 진한 맛의 양념을 한다. 김장에 들어가는 젓갈도 지방마다 다른데 함경도, 평안도 등 북부지방과 중부지방은 새우젓, 조기젓이 많고, 경상도, 전라도 등 남부지방은 멸치젓을 주로 사용한다. 이밖에 해산물을 즐기는 함경도에서는 주로 명태를 넣고, 평안도에서는 쇠고기국물을 넣기도 하고, 전라도에서는 찹쌀풀이나 쌀을 넣는다.
여자들이 김장을 하면 남자들은 구덩이를 파고 김칫독을 묻었다. 김장김치는 5℃ 전후의 낮은 온도에서 익히고 저장해야 맛이 좋고 변질되지 않는다. 그래서 보통 김치광을 따로 두어 그곳에 김칫독을 묻고 짚방석을 만들어 덮는다. 요즘에는 김칫독 묻는 일은 거의 없고 김치냉장고가 이를 대신하고 있다. 김장이 다 끝나고 나면 돼지고기를 삶고 배추의 노란 속잎과 양념을 준비하여 쌈을 싸 먹으면서 동네잔치가 벌어지고는 했다.
우리 조상들은 김치와 장을 얻어먹는 것을 부끄러운 일로 여겼다. 요즘은 모든 것이 간소화되면서 절인 배추를 사용해 김장을 하거나 집에서 담그지 않고 사먹는 일도 많지만, 김장은 여전히 우리가 겨울을 맞는 하나의 음식문화이다.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인식될 때까지 오래 지속되어야 그것을 문화라고 부를 수 있다. 우리에게 김장문화가 그렇다. 김장은 누구의 강요도 아닌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켜온, 그리고 우리가 꼭 지켜내야 할 우리의 문화이다.
- 네이버지식백과(http://terms.naver.com)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 두산백과(http://www.doopedia.co.kr)
-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김치 백가지』, 현암사, 1999.
- 동아일보, 「김장담그기 몇 가지」, 1960.11.10.
- 경향신문, 「주영하의 음식 100년(9) 배추김치」, 2011.5.3.
- 아시아경제, 「요리수다 지혜로운 겨울 저장식 '김장'」, 2015.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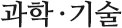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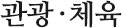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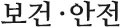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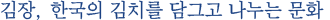
![[대한뉴스 제904호] 올해도 풍성한 김장](/next/images/recordKorea/gimjang_thumbnail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