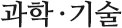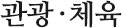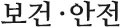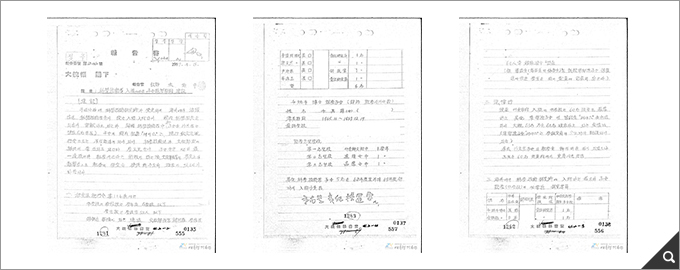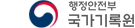우리에겐 ‘과학’이란 무엇일까?
대번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등장할 법한 최첨단 과학 장비들, 어려운 공식들, 괴짜 과학자의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는 않았는가? 아니면 젊은이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이나 아이들의 장래희망 속에서 과학자가 사라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떠올렸는가?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 인터넷, TV, 냉장고 등 우리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작은 전자제품 역시 과학의 발달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도 과학이라고 하면 우리와 관계없는, 어렵고 먼 것이라고만 생각한다.
1965년 7월 8일 오후 5시. 이날 특별한 사람들이 김포공항을 통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당시 미국 존슨 대통령의 과학고문 겸 미국 과학기술원장이었던 호닉 박사와 그의 일행. 그들의 방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였다.
"호닉 박사 일행은 1주일 동안 체한하면서 한국의 산업기술과 응용과학 발전을 위한 연구기관을 설치함에 있어서 미국의 원조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기간산업 및 교육기관 과학시설을 시찰한다."(「오늘 내한 호닉 박사 일행」, 경향신문 1965년 7월 8일자 기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회장이었던 최형섭 박사는 1992년 발표된 자신의 회고록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소 태동의 뒷이야기를 밝혔는데, 그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가 우리나라의 월남 파병에 대한 미국의 보답이었다고 했다. 원래는 공과대학을 지어주겠다는 제의였으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공업기술연구소를 지어 달라'고 요청했고, 한미공동성명 마지막 항목에 실무진 모르게 그 조항이 삽입되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호닉 박사의 방문은 그 마지막 항목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호닉 박사는 한국에 세워질 과학기술연구소가 독립기관으로 발족해야 하며, 최고 수준에 달하는 기술자 8~9명으로 출발해야 할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그의 바람대로 1966년 세워진 한국과학기술연구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출연 연구소이자 한미정부의 지원으로 설립·운영되지만 자율적 운영을 위해 법적으로는 재단법인으로 출발하였다.
방한한 지 일주일이 되던 7월 15일 호닉 박사는 1년 이내에 연구소가 설립될 것을 희망한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남기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8월 미국 존슨 대통령은 우리에게 과학기술연구소 설립지원을 확정한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하지만 연구소에서 일할 연구원이 문제였다. 해외 과학자를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당시 문제는 세 가지로 요약되었다. 첫째, 얼마나 많은 교민 과학자들이 해외에 있는가? 둘째, 전공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셋째 해외 과학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원칙과 조건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과학기술연구소의 초대 소장이었던 최형섭 박사는 1966년 10월 직접 미국으로 건너갔다. 6.25전쟁 이후 미국 등 선진국으로 건너간 우리 과학인재들을 만나 그들의 의향을 파악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첫 연구원으로 데려오기 위한 프로젝트의 이름은 ‘두뇌유치’였다.
그렇게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과학자 70명을 만났고, 이들 중 60명이 고국으로 들어와 연구를 계속할 의향이 있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그 중 우리 산업과 직결되는 연구부문으로 인재를 뽑았다. 광업, 금속정련, 식품공업, 전자기기, 금속가공, 합성섬유, 에너지, 건축 재료 등 8개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5년 이상 경험자로 연구논문을 수 편 이상 발표한 과학자와는 개별적으로 계약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그들에겐 2백 달러에서 4백 달러의 월급이 지급됐다.
해외 과학자 초빙 프로젝트의 가장 큰 성과는 컬러TV의 국산화였다. 이후 국산 컴퓨터를 만들기 위한 해외 과학자 초빙 프로그램이 시행되었고, ‘한국 인터넷의 아버지’라 불리는 전길남 박사 역시 이 프로그램에 응해 고국 땅을 밟은 과학자였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컴퓨터를 활용한 네트워크망을 만들었으며, 지금의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 된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970년대 말 그는 미국에서 연구원 생활을 접고 한국 땅을 밟았다. 정부 차원에서 그를 초청한 것인데, 그는 경제수준이 아프리카 가나 수준이었던 우리나라에서 컴퓨터 하드웨어나 운영체제(OS)를 만드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당시를 기억했다. 우리나라에는 PC란 말조차 들어본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렇게 우리는 멀고도 험한 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역사를 만들어온 것이다.
얼마 전 울산과학기술대에서 열린 기술경영경제학회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경제․사회적 효과 분석 연구’가 발표되었다. 1966년 해외 과학자들을 초청해 와 겨우겨우 살림을 꾸리던 한국과학기술연구소는 47년 만에 우리 경제에 미친 파급효과가 595조 원에 달한다는 평가를 얻었다. 거기에 KIST의 10대 대표기술도 선정되었다. 가변용량 다이오드를 이용한 휴대용TV 수상기, 푸시버튼 전화기, 염료합성기술, 컬러TV 수상기, 고강도 아라미드 섬유기술, 지속성 복합비료 기술, 캡슐형 내시경 미로 등이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아는 것도 있고, 금시초문인 것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지난 날 과학의 가능성을 믿었다는 점이다. 끝없는 실험정신이 훌륭한 과학자가 되기 위한 자질이라면, 어려운 시절 고국으로 돌아와 나라의 발전을 위해 무한한 도전과 열정을 쏟아낸 해외 과학자들이야말로 진정 훌륭한 과학자가 아닐까 생각된다.
- 경향신문, 「과학연구원’ 등 독립기관으로」, 1965.7.10.
- 경향신문, 「한국 과학기연 설치 존슨, 적극 지원 지시」, 1965.8.6.
- 김상선, 김석준, 김영섭 외, 『과학대통령 박정희와 리더십』, MSD미디어, 2010.
- 동아일보, 「고국에서 일하고 싶다」, 1966.12.22.
- 동아일보, 「호니그 박사단 "과학기술 연구소 연내 설립 기대"」, 1965.7.15
- 매일경제, 「한국과학기술 외교 비사 공개 」, 1997.10.9.
- 이데일리, 「누구나 사랑하는 인터넷을 만들자」, 2012.5.29.